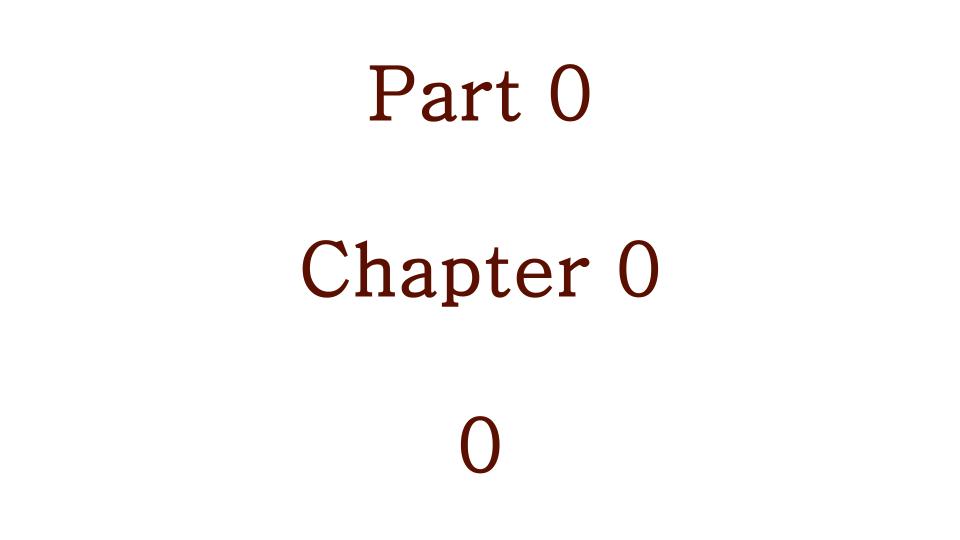한눈에 보는 항원 관련 용어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항원 관련 용어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면역학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항원’, ‘면역원’, ‘합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원결정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용어 | 정의 | 면역원성 (반응 유발 능력) | 비유 |
|---|---|---|---|
| 항원 (Antigen) | 항체나 림프구에 의해 인식되는 모든 물질 |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 | 외부에서 온 모든 ‘낯선 사람’ |
| 면역원 (Immunogen) | 실제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항원 | 있음 (O) | 실제 위협이 되는 ‘무장 강도’ |
| 합텐 (Hapten) | 혼자는 반응 못 일으키나 운반체와 결합하면 항원이 되는 작은 물질 | 혼자서는 없음 (X) | 인질과 결합해야 위협이 되는 ‘ 작은 칼’ |
| 항원결정기 (Epitope) | 항원 중에서 항체/림프구가 실제 결합하는 특정 부위 | 항원의 일부이므로 면역원성 없음 | 강도의 ‘얼굴’ 또는 ‘무기’ |
결론: 표적지를 알아야 명중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응면역이 보여주는 놀라운 ‘특이성’과 ‘기억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이 면역계의 표적지, 즉 항원결정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면역계는 적의 전체 모습이 아닌, 가장 특징적인 부위인 항원결정기를 기억하고, 다음 침입 시 그 표적지만을 다시 노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B세포와 T세포가 서로 다른 형태의 항원결정기를 인식한다는 점은 우리 몸의 방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입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B세포는 적의 외부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공격하고, T세포는 적의 내부 정보(단백질 조각)를 브리핑 받아 세포에 숨은 적까지 색출해냅니다. 이 두 시스템의 공조 덕분에 우리 몸은 훨씬 더 촘촘하고 빈틈없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원결정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의학, 특히 백신 개발과 질병 진단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체의 수많은 부위 중 어떤 항원결정기를 면역계에 보여줘야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방어력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1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한 항체나 T세포 반응을 측정하는 진단 기술 역시, 특정 항원결정기에 대한 반응을 감지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2
그렇다면, B세포가 만들어내어 이 면역계의 표적지에 정확히 결합하는 유도 미사일, ‘항체’는 과연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적응면역의 핵심 무기, ‘항체(면역글로불린)’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Skwarczynski, M., & Toth, I. (2016). Peptide-based synthetic vaccines. Chemical Science, 7(2), 842–854. https://doi.org/10.1039/C5SC03892H
- Chopra, S., B-Rao, C., & Ranganathan, A. (2003). Epitope mapping: a new paradigm for diagnosis and monitoring of infectious diseases. Indian Journal of Medical Microbiology, 21(4), 221-228. https://www.ijmm.org/article.asp?issn=0255-0857;year=2003;volume=21;issue=4;spage=221;epage=228;aulast=Chop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