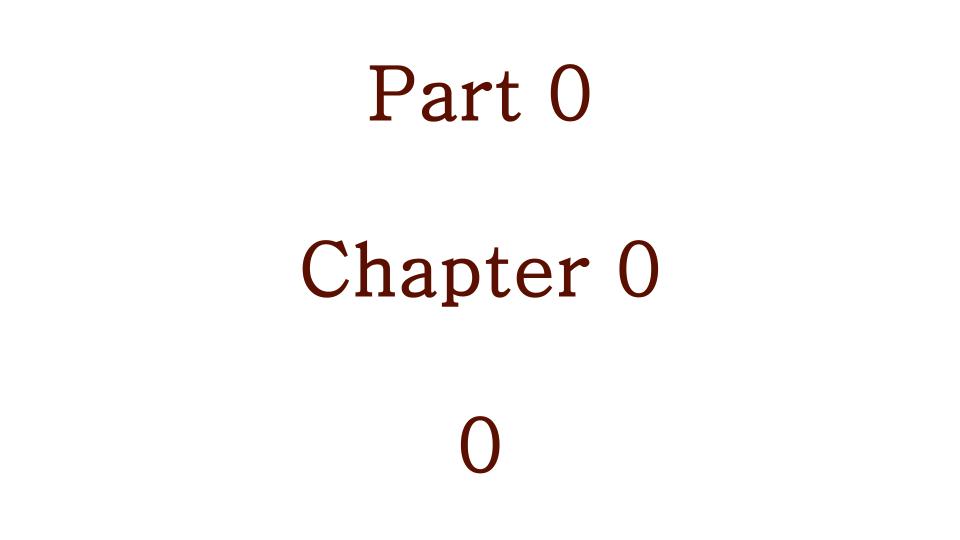염증 반응의 전개 과정: 출동부터 진화까지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염증 반응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혼란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듯, 매우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정교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을 ‘경보 발령’, ‘현장 도착’, ‘진압 작전’, 그리고 ‘복구 및 재건’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 몸의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경보 발령 및 출동로 확보
모든 것은 첫 번째 ‘위험 신호’의 감지에서 시작됩니다. 손상된 조직의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내뿜는 내부 물질(DAMPs: 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s)이나, 침입한 세균이 가진 고유한 분자 패턴(PAMPs)을 그 지역에 상주하던 파수꾼, 즉 대식세포나 비만세포가 가장 먼저 인식합니다.1
위험을 감지한 이 파수꾼들은 즉시 화학적 사이렌을 울립니다.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TNF-α나 IL-1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주변으로 뿜어냅니다. 이 화학 신호들은 즉시 주변 모세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발적, 열감의 원인) 혈관 벽의 투과성을 높여(부종의 원인) 앞으로 도착할 면역세포들을 위한 ‘출동로’를 확보하는, 그야말로 염증 반응의 서막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 면역세포의 현장 도착 및 침투
경보를 들은 면역세포들은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도착하는 것은 선천면역의 최정예 돌격부대인 호중구(Neutrophils)입니다.
평소에는 혈류를 따라 빠르게 지나치던 호중구들은, 감염 부위의 혈관벽에서 발현된 특정 유착 분자(셀렉틴 등)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며 혈관벽을 따라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합니다(Rolling & Adhesion). 그러다 마침내 틈이 벌어진 혈관 벽을 비집고 조직으로 빠져나갑니다(Diapedesis).2 이렇게 최전선에 도착한 호중구를 시작으로, 몇 시간 뒤에는 더 크고 강력한 포식자인 대식세포(Macrophages)의 전신인 단핵구(Monocyte)가 뒤이어 도착하여 전투에 합류합니다.
3단계: 병원체 제거 및 잔해 처리
현장에 도착한 호중구와 대식세포는 본격적인 진압 작전, 즉 식균 작용(Phagocytosis)을 개시합니다. 이들은 침입한 세균이나 죽은 세포들을 탐욕스럽게 집어삼켜 자신의 내부에서 분해해 버립니다. 이때 혈액 속의 보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C3b와 같은 분자를 세균 표면에 붙여주면(옵소닌화), 식세포들은 이 표식을 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수많은 호중구들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이들의 시체와 세균의 파편, 녹아내린 조직의 잔해들이 한데 모여 걸쭉한 액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고름(Pus)’입니다.3 고름은 치열했던 염증 반응의 흔적이자, 우리 면역세포들의 희생이 담긴 증거인 셈입니다.
4단계: 복구 및 재건 (Resolution & Repair)
병원균이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위협이 사라지면, 염증 반응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전투를 멈추고 복구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리폭신(Lipoxins), 레졸빈(Resolvins)과 같은 항염증 물질들이 분비되어 염증을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4
이 단계에서 대식세포는 돌격대원의 역할에서 ‘현장 청소부’이자 ‘재건 감독관’으로 변신합니다. 이들은 죽은 호중구의 시체를 깨끗이 먹어치우고(Efferocytosis),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손상되었던 조직의 세포들이 다시 분열하고 자라나도록 촉진합니다. 이 섬세한 복구 과정 덕분에 우리의 피부는 흉터 없이 아물고, 조직은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Kono, H., & Rock, K. L. (2008). How dying cells alert the immune system to danger. Nature Reviews Immunology, 8(4), 279–289. https://doi.org/10.1038/nri2215
- Ley, K., Laudanna, C., Cybulsky, M. I., & Nourshargh, S. (2007). Getting to the site of inflammation: the leukocyte adhesion cascade updated. Nature Reviews Immunology, 7(9), 678–689. https://doi.org/10.1038/nri2156
- Weiss, S. J. (1989). Tissue destruction by neutrophil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0(6), 365–376. https://doi.org/10.1056/NEJM198902093200606
- Serhan, C. N., Brain, S. D., Buckley, C. D., Gilroy, D. W., Haslett, C., O’Neill, L. A., Perretti, M., Rossi, A. G., & Wallace, J. L. (2007). Resolution of inflammation: state of the art, definitions, and charms. The FASEB Journal, 21(2), 325–340. https://doi.org/10.1096/fj.06-7227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