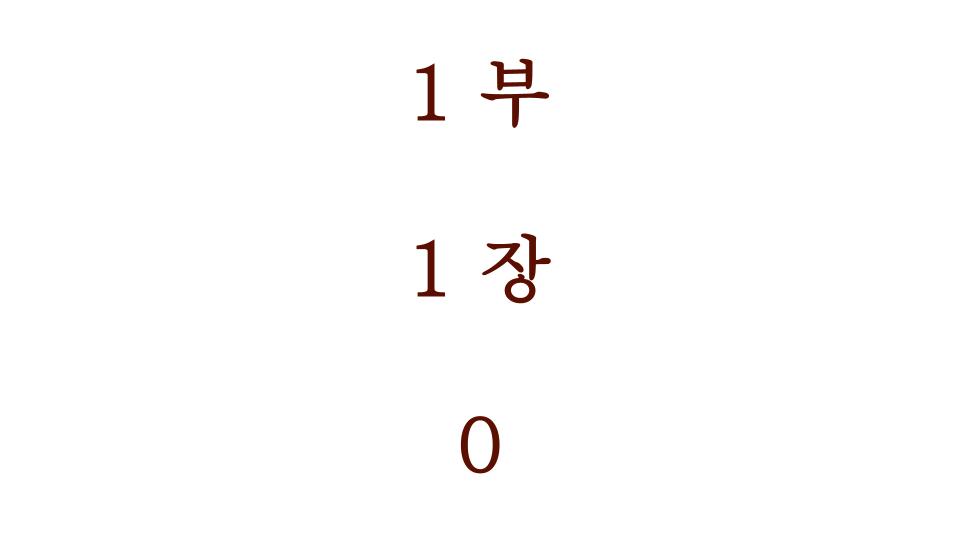쓰고 남은 물은 어떻게 나갈까? 건강한 순환의 마침표, 진액의 배설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물이 소화기관의 정교한 공정을 거쳐 몸속 수분 진액으로 재탄생하고(생성), 비·폐·신의 협력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적시는(수포)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맑게 유지되려면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만큼, 낡은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몸속 수분 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순환의 마지막 단계, 바로 쓰고 남은 진액이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되어 우리 몸의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배출해야 할까? 맑은 샘을 유지하는 원리
생성된 몸속 수분 진액이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섞여 탁해집니다. 만약 이 탁해진 수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정체되면,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痰飮)’이나 ‘습담(濕痰)’이라는 병리적인 물질로 봅니다.[1] 이는 몸을 무겁게 만들고, 붓게 하며, 각종 염증과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액의 배설은 단순히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샘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화 과정입니다. 건강한 몸속 수분 진액의 순환은 잘 만들고, 잘 돌리고, 잘 비워내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완성됩니다.
몸 밖으로 나가는 세 가지 길: 땀, 소변, 호흡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사용을 마친 몸속 수분 진액과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과정은 폐(肺), 신(腎), 방광(膀胱) 등의 장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1. 피부의 창, 땀(汗)으로의 배출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배출 경로는 바로 ‘땀’입니다. 땀은 피부의 땀구멍(현부, 玄府)을 통해 배출되는 액체로,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肺主皮毛)’, 즉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폐의 선발(宣發) 기능이 땀구멍을 열고 닫는 것을 조절하여 몸속 수분 진액의 일부를 땀으로 내보내, 체표의 열을 식히고 노폐물을 배출하게 합니다.[2] 따라서 적절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몸속 수분 진액이 정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 몸의 정수기, 소변(尿)으로의 배출
진액 배설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경로는 ‘소변’입니다. 온몸을 순환하며 탁해진 몸속 수분 진액은 최종적으로 신(腎)으로 모입니다. 신은 ‘기화(氣化)’ 작용을 통해 이 탁한 진액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수합니다. 여기서 맑은 부분은 재흡수하여 위로 보내 다시 순환시키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노폐물과 수분은 방광(膀胱)으로 보내 소변으로 만듭니다.[3] 즉, 신과 방광은 우리 몸의 수분 양을 조절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 양, 횟수는 몸속 수분 진액의 대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지표가 됩니다.
3. 보이지 않는 배출, 호흡(呼吸)으로의 배출
우리가 숨을 내쉴 때도 미량의 몸속 수분 진액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됩니다. 추운 날 입김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폐의 선발(宣發) 및 숙강(肅降) 기능, 즉 호흡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 몸 안에 정체된 탁한 기운과 함께 불필요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몸속 수분 진액 대사의 균형을 돕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중요한 배출 경로입니다.
| 배설 경로 | 주요 역할 | 핵심 주관 장부 | 관련 생리 작용 |
|---|---|---|---|
| 땀 (汗) | 체온 조절 및 체표 노폐물 배출 | 폐 (肺), 심 (心) | 폐의 선발(宣發), 위기(衛氣)의 조절 |
| 소변 (尿) | 체내 노폐물 및 과잉 수분 배출, 수분 균형 조절 (핵심) | 신 (腎), 방광 (膀胱) | 신의 기화(氣化) 작용, 비별청탁(泌別淸濁) |
| 호흡 (呼吸) |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및 탁기(濁氣) 배출 | 폐 (肺) | 폐의 선발(宣發)과 숙강(肅降) |
이처럼 우리 몸의 몸속 수분 진액은 생성-순환-배설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건강한 배설은 단순히 비워내는 행위를 넘어, 남아있는 진액을 더욱 맑고 활력 있게 만드는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로써 ‘진액’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 과정(생성, 수포, 배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질과 역할이 다른 진액의 두 종류, ‘진(津)’과 ‘액(液)’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담습(痰濕)’. – 이 자료는 담습을 “수액대사장애로 진액이 국소에 정체되어 형성된 병리적 산물”로 정의하며, 진액 배출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 『通調水道에 관한 意味와 現代的 再解釋』,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 이 논문은 폐의 ‘통조수도’ 기능이 선발과 숙강을 통해 체내 수액(진액)을 운수, 산포하고 땀과 호흡을 통한 배설을 조절하는 기능임을 설명합니다.
- ‘[한의학] 한방생리- 정 신 기 혈 진액’, 선혜지의 블로그. – 이 자료는 폐의 숙강 기능을 통해 신으로 수송된 진액이 신과 방광의 기화 기능으로 소변이 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