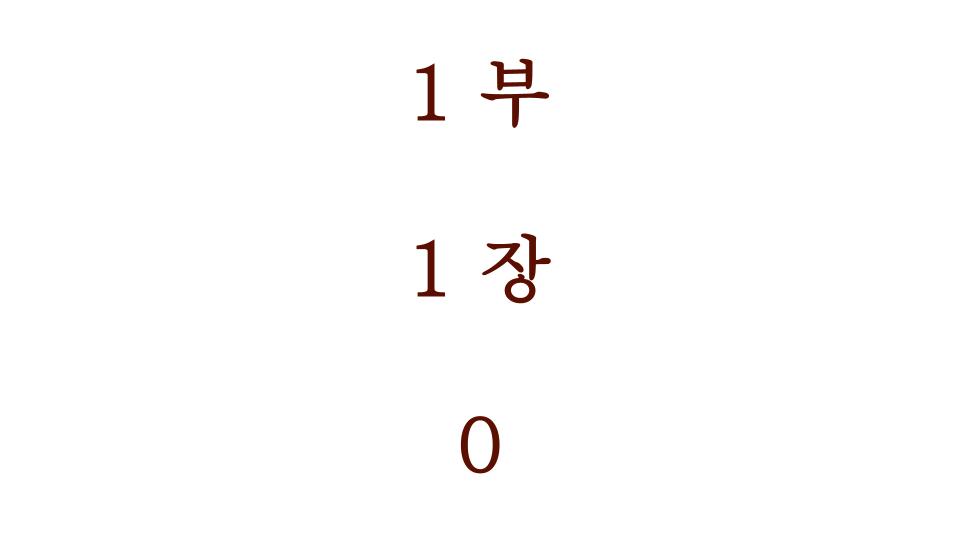혈액의 통제와 저장: 비(脾)와 간(肝)의 조절 기능
지난 시간에는 심장(心)의 펌프 작용과 폐(肺)의 보조 작용이 어떻게 한의학 혈(血)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순환은 단순히 밀어내고 이끄는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이 단단해야 하고, 가뭄에 대비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 역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부가 바로 비장(脾臟)과 간(肝)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혈액의 충실한 파수꾼, 비장과 거대한 저수지, 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비(脾)의 통혈(統血) 기능: 혈액의 충실한 파수꾼
비장의 여러 기능 중 하나는 ‘통혈(統血)’, 즉 혈액을 통솔하여 맥관(脈管) 밖으로 함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입니다.[1] 이는 비장(脾臟)의 기운, 즉 비기(脾氣)가 가진 ‘붙잡고 끌어올리는’ 고섭(固攝) 작용의 일환입니다. 튼튼한 제방이 강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것처럼, 왕성한 비기는 혈액이 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로나 부적절한 식습관, 과도한 생각 등으로 비기가 허약해지면(脾氣虛)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면서 ‘비불통혈(脾不統血)’ 상태가 됩니다. 이는 혈액이 맥관 밖으로 쉽게 새어 나오는 각종 출혈성 경향으로 이어집니다.[2]
- 피하 출혈: 살짝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듭니다.
- 치은 출혈: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납니다.
- 변혈(便血) 및 붕루(崩漏):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여성의 경우 월경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부정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출혈이 반드시 혈소판 수치 감소와 같은 혈액 성분의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의학 혈의 관점에서 이는 혈액을 제어하는 ‘기능’의 저하로 파악하며, 비기를 보충하여 혈액을 다시 통섭하게 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간(肝)의 장혈(藏血) 기능: 혈액의 거대한 저수지
비장이 혈액의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간(肝)은 ‘장혈(藏血)’, 즉 혈액을 저장하고 전신의 혈액량을 조절하는 거대한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간을 ‘혈해(血海)’, 즉 피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3]
간의 혈액량 조절 기능은 인체의 활동 상태에 따라 역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휴식 및 수면 시: 인체가 휴식을 취할 때는 활동에 필요한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남은 혈액은 간으로 돌아와 저장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액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간은 다음 활동을 준비합니다. 숙면이 피로 회복과 ‘피를 보충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활동 및 운동 시: 인체가 활동하거나 운동할 때는 근육과 사지에 더 많은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때 간은 저장하고 있던 혈액을 방출하여 필요한 부위로 보내줍니다. 간이 근육(筋)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유도, 간이 저장한 혈액이 근육의 원활한 운동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4]
만약 간의 장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량 조절에 실패하여 활동 시 근육에 피로와 경련이 쉽게 오거나,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월경량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간의 기운이 막히는 ‘간기울결(肝氣鬱結)’이 발생해도 장혈 기능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 구분 | 비(脾)의 통혈(統血) | 간(肝)의 장혈(藏血) |
|---|---|---|
| 핵심 기능 | 혈액이 맥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통제 | 전신 혈액량을 필요에 따라 저장 및 분배 |
| 작용 방식 | 비기(脾氣)의 고섭(固攝) 작용으로 혈액을 붙잡음 | 활동과 휴식에 따라 혈액을 저장하거나 방출함 |
| 기능 이상 시 | 각종 출혈 경향 (멍, 혈변, 부정출혈 등) | 혈액량 조절 실패 (근육경련, 월경불순 등) |
이처럼 심장과 폐가 혈액 순환의 동력을 제공한다면, 비장과 간은 그 순환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 장부의 기능이라도 부족해지면 한의학 혈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부들의 복합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오장육부(五臟六腑)」. “비는 혈을 통솔한다.” (원문: “脾統血”) [원문 검색]
- 전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일중사, 2011. “비기허(脾氣虛)로 통혈 기능이 실조되면 혈액이 맥외로 넘쳐 각종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비불통혈(脾不統血)이라 한다.” [도서 정보 확인]
- 허준,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오장육부(五臟六腑)」. “간은 혈을 저장한다.” (원문: “肝藏血”) [원문 검색]
-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동의생리학』, 집문당, 2016. “간의 장혈(藏血) 기능은 혈액을 저장하고 인체의 활동량에 따라 혈액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활동 시에는 혈액을 각 기관에 보내고, 안정 시에는 혈액을 간으로 돌아오게 한다.” [도서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