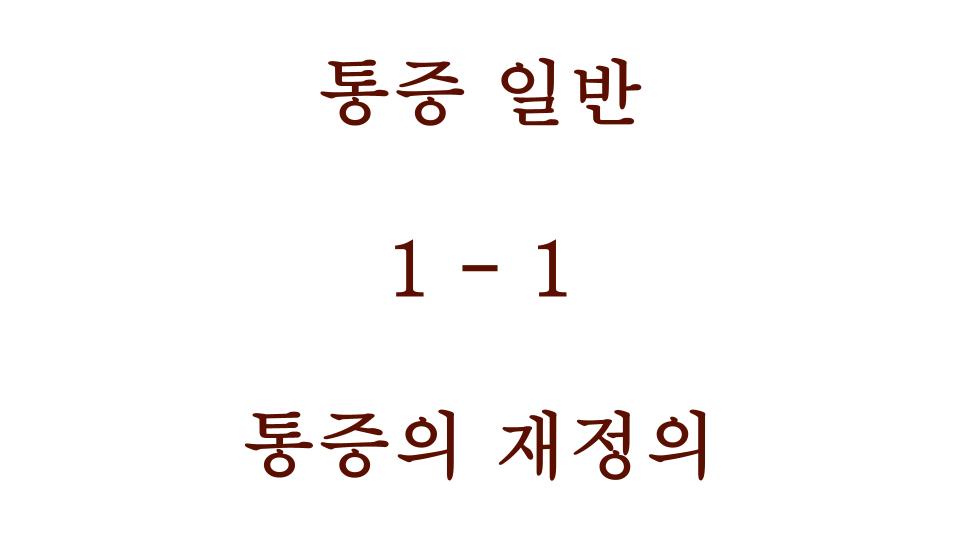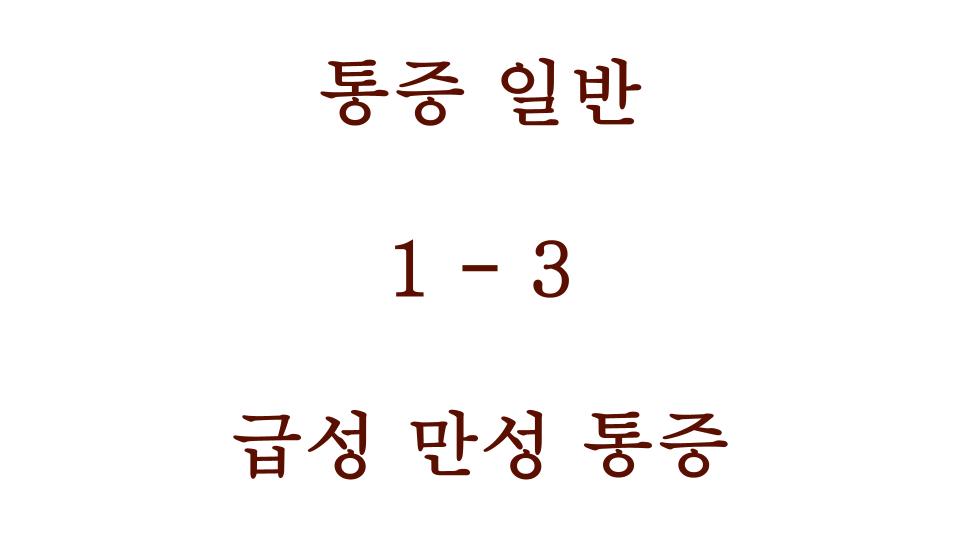하나의 통증 신호가 뇌에 도착하기까지: 4단계 릴레이 경주
우리 몸에서 ‘아프다’는 느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과정은 마치 긴급 전보를 전달하거나, 4명의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손상된 신체 부위에서 출발한 신호가 뇌라는 결승선에 도달해 ‘통증’이라는 이름표를 받기까지,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정교하고 역동적인 사건들이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그 4단계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전환 (Transduction) – 위험 감지, 신호탄 발사!
모든 통증의 시작점에는 우리 몸 곳곳에 배치된 특수 센서, 바로 ‘통각수용기(Nociceptor)’가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근육, 관절, 내장기관 등에 넓게 분포하며 우리 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물리적 압력, 극심한 온도(열 또는 냉기), 그리고 조직 손상 시 발생하는 화학 물질 같은 유해한 자극을 감지하는 순간, 즉시 이 자극을 전기 신호로 ‘번역’하거나 ‘전환(Transduction)’합니다.[1]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피부에 있던 통각수용기가 50℃ 이상의 위험한 열을 감지하고, “앗, 뜨거워! 위험해!”라는 정보를 순식간에 전기 신호로 바꿔 신경계에 발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 릴레이 경주의 첫 번째 주자가 쏘아 올린 신호탄입니다.
2단계: 전도 (Transmission) – 척수를 향한 고속도로 질주
일단 전기 신호로 변환된 위험 정보는 ‘신경 섬유’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척수를 향해 질주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전도(Transmission)’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고속도로에는 차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빠른 ‘1차선’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느린 ‘2차선’입니다.[2]
- A-델타(Aδ) 섬유 (빠른 1차선): 굵고 전선 피복(수초)이 잘 감싸져 있어 신호를 매우 빠르게 전달합니다. 이 섬유는 우리가 ‘아야!’하고 느끼는, 순간적이고 날카로운 1차 통증을 담당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위험을 즉시 인지하고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
- C 섬유 (느린 2차선): 가늘고 피복이 없어 신호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달합니다. 이 섬유는 손상 부위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욱신거리고, 타는 듯하고, 둔하게 아픈 2차 통증을 담당합니다. 이 통증은 우리에게 손상된 부위를 계속 보호하고 쉬게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두 신경 섬유의 속도 차이 때문에, 우리는 종이에 손을 베었을 때 ‘앗!’ 하는 날카로운 첫 통증을 느끼고 난 뒤, 한동안 욱신거리는 통증이 뒤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1차 통증과 2차 통증
| 특징 | 1차 통증 (First Pain) | 2차 통증 (Second Pain) |
|---|---|---|
| 전달 섬유 | A-델타(Aδ) 섬유 | C 섬유 |
| 전달 속도 | 빠름 (초속 5~30m) | 느림 (초속 2m 이하) |
| 통증의 성격 | 날카로움, 찌르는 듯함, 명확한 위치 | 둔함, 욱신거림, 타는 듯함, 모호한 위치 |
| 주요 기능 | 위험의 즉각적인 회피 | 손상 부위의 지속적인 보호 및 회복 유도 |
이 표는 우리 몸이 통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전달하는 이유와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4단계: 인지 (Perception) – 뇌의 해석, ‘아픔’의 완성
척수까지 도착한 통증 신호는 경주의 세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신호는 뇌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상(Thalamus)을 거쳐, 마침내 뇌의 여러 영역으로 퍼져나가 최종적으로 ‘아프다’는 주관적인 경험, 즉 ‘인지(Perception)’ 단계에 도달합니다.[3] 이 단계에서 뇌는 단순히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 인지 단계 전에 ‘통증 조절(modulation)’단계가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4단계로 통증의 인지가 완성됩니다. 단, 조절 단계의 내용에는 관문 조절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 페이지에 별개로 작성합니다.
뇌의 역할 분담: 통증 경험을 만드는 어벤져스
통증 신호는 뇌의 특정 ‘통증 센터’ 한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영역이 협력하여 입체적인 통증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 감각 피질 (이성적 분석가): “왼쪽 검지 끝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찌릿하게 아프군. 강도는 10점 만점에 7 정도야.” 와 같이 통증의 위치, 성격, 강도 등 물리적인 정보를 분석합니다.
- 변연계 (감정적 연출가): “이 통증 정말 불쾌해. 이러다 감염되는 거 아냐?” 처럼 통증에 불안, 공포,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적인 색채를 입힙니다.
- 전두엽 (총사령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이건 대수롭지 않은 상처니 밴드만 붙이면 돼.” 라고 판단하고, 통증에 대한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뇌의 여러 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증 경험은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이 단순한 감각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입체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
- 김문점, & 유양숙. (2009). 통증의 생리 및 사정. 기본간호학회지, 16(2), 239-247. 통증의 발생 기전 중 첫 단계인 ‘전환(Transduction)’과 통각수용기(Nociceptor)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957956690941.pdf
- 통증. (2024). 위키백과. 통증 신호가 A-델타 섬유와 C 섬유를 통해 척수로 전달되는 ‘전도(Transmission)’ 과정을 설명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C%A6%9D
- 통증 [pain]. (2012).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통증 신호가 시상을 거쳐 대뇌피질에 도달하여 ‘인지(Perception)’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https://www.jaenung.net/tree/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