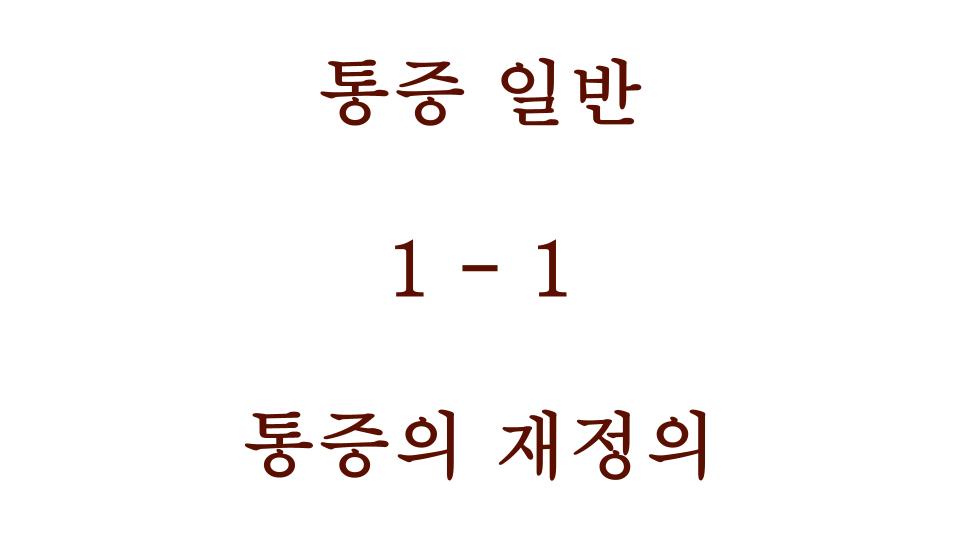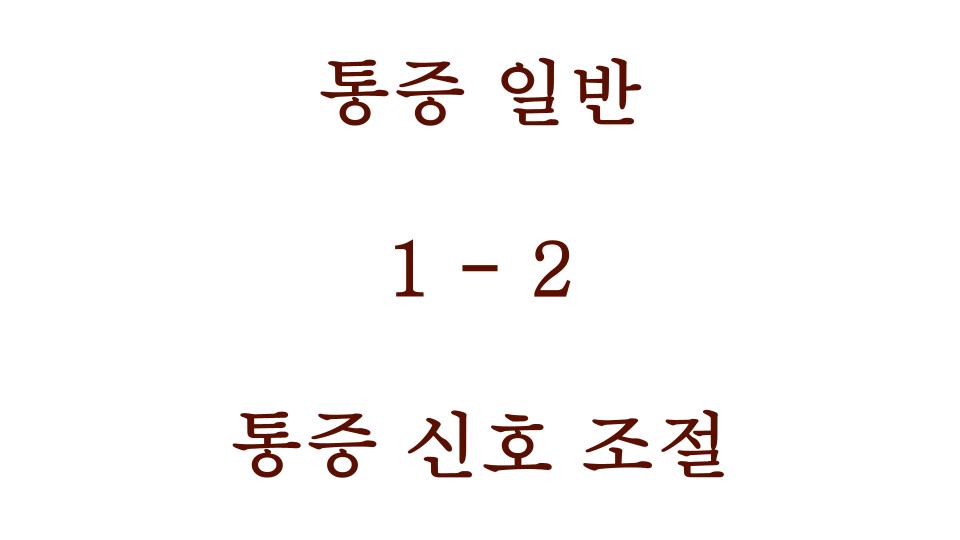우리 몸의 진통 시스템: 내인성 통증 억제계
통증 신호가 말초에서 뇌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상처에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뇌는 단순히 통증을 수동적으로 인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정교한 ‘자체 진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1 이번 글에서는 우리 몸에 내장된 이 놀라운 진통 시스템, 즉 ‘내인성 통증 억제계(Endogenous Pain Inhibitory System)’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신비로운 통증의 원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고도 통증을 잊은 채 뛰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은 모두 이 내인성 통증 억제계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의 존재는 통증이 객관적인 자극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우리의 심리 상태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통증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하향식 통제: 하행성 통증 억제계
우리 몸의 자체 진통 시스템의 핵심은 뇌간(Brainstem)에서 시작되어 척수로 신호를 내려보내는 ‘하행성 통증 억제계(Descending Pain Inhibitory Pathway)’입니다.2 이는 통증 신호가 말초에서 척수를 거쳐 뇌로 올라가는 ‘상행성 경로’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하향식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중뇌수도관주위 회색질(PAG)과 연수의 거대세포핵(RVM)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험이나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억제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 부위들이 활성화되어,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세포들에게 “지금 올라오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통증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증의 원리입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천연 마약: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그렇다면 뇌는 어떤 방법으로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할까요? 바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화학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행성 통증 억제계가 활성화되면, 척수의 통증 관문(후각)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가 분비됩니다.3
- 엔도르핀 (Endorphin):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이라는 뜻을 가진 강력한 아편유사 펩타이드입니다. 엔도르핀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통증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와 같은 희열감도 엔도르핀의 작용입니다.
- 세로토닌 (Serotonin):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세로토닌 역시 중요한 통증 억제 신경전달물질입니다. 뇌간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은 척수에서 통증 신호의 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항우울제가 이 세로토닌 시스템에 작용하여,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의 원리 때문입니다.
- 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증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주요 구성 | 핵심 역할 |
|---|---|---|
| 중추신경계 영역 | 중뇌수도관주위 회색질(PAG), 연수(RVM) | 통증 억제 신호를 시작하는 사령부 |
| 주요 신경전달물질 | 엔도르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 통증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화학 무기 |
| 임상적 예시 | 플라시보 효과, 스트레스 유발성 진통 | 심리적, 인지적 요인이 통증을 조절하는 증거 |
“믿음이 통증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먹었을 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는 바로 이 내인성 통증 억제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4 즉, 뇌가 ‘통증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천연 진통제를 분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증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성 통증 환자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명상, 이완 요법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통증이 우리 뇌에 기억처럼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즉 ‘통증 기억’과 ‘신경가소성’이라는 통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Fields, H. (2004). “State-dependent opioid control of pai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5(7), 565–575.
- Ossipov, M. H., Dussor, G. O., & Porreca, F. (2010). “Central modulation of pain”.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20(11), 3779–3787.
- Millan, M. J. (2002). “Descending control of pain”. Progress in neurobiology, 66(6), 355–474.
- Benedetti, F., Mayberg, H. S., Wager, T. D., et al. (2005). “Neurobiological mechanisms of the placebo effect”.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5(45), 10390–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