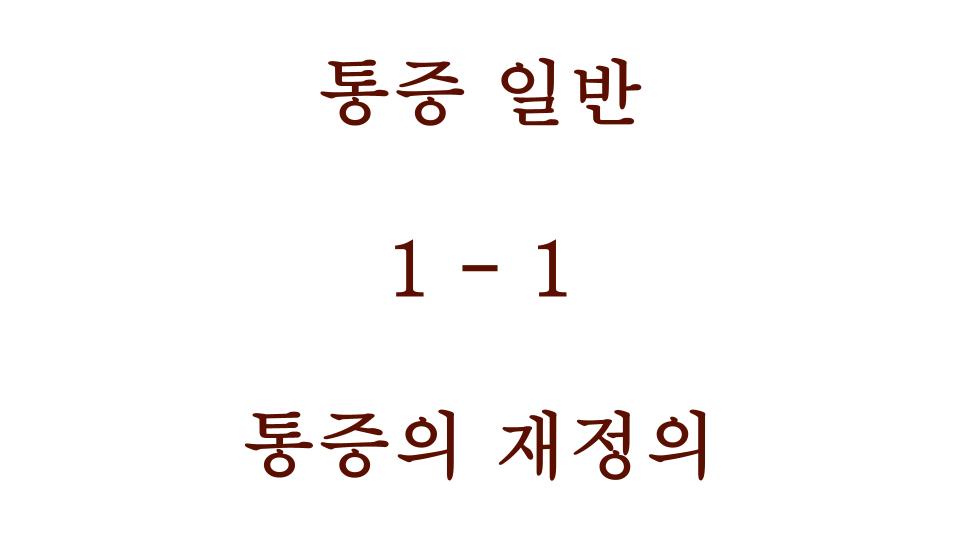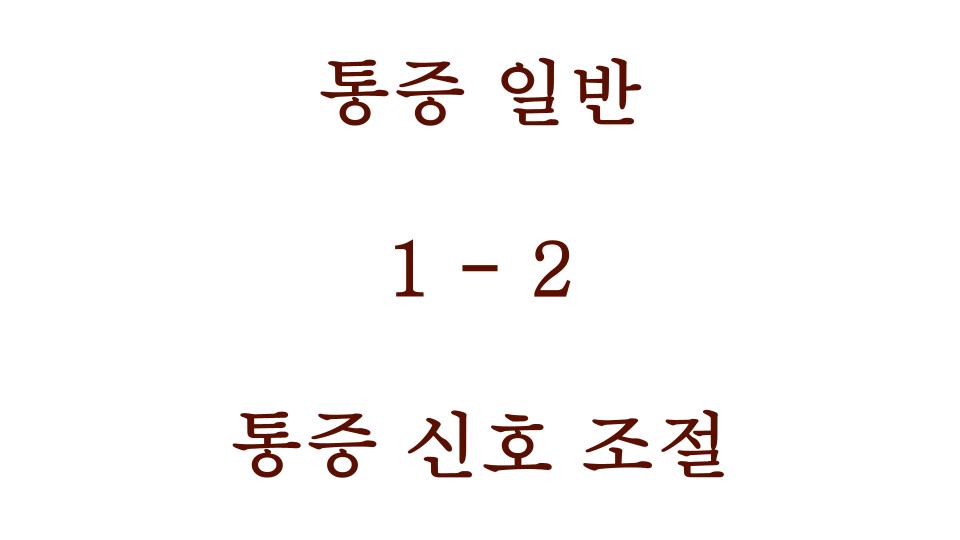통증이 더 아파지는 이유: 말초 감작과 중추 감작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왜 통증은 계속될까요? 햇볕에 살짝 탔을 뿐인데 왜 옷깃만 스쳐도 살이 아릴까요? 이러한 현상들은 통증이 단순히 조직 손상에 비례하는 감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통증은 우리 신경계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증폭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성통증이 만성통증으로 변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자,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인 ‘감작(Sensitization)’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감작을 이해하는 것은 만성 통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작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손상 부위 자체, 즉 말초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말초 감작’이고, 다른 하나는 척수와 뇌, 즉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중추 감작’입니다. 이 두 가지 통증의 원리는 통증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1. 말초 감작 (Peripheral Sensitization): 예민해진 현장의 감시 카메라
말초 감작이란, 손상된 조직 주변의 유해수용기(통증 감지 센서)가 매우 예민해져서, 이전에는 반응하지 않았을 약한 자극에도 쉽게 통증 신호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2 이는 마치 도둑이 들었던 집의 경보 시스템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시끄럽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직이 손상되면, 그 주위로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프로스타글란딘, 브라디키닌 등)들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 칵테일’은 유해수용기의 활성화 역치를 낮춥니다. 즉, 통증 경보가 울리는 기준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햇볕에 탄 피부(일광화상)입니다.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옷깃이 스치는 가벼운 자극이나 미지근한 물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초 감작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말초 감작은 급성 염증 반응의 일부이며,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려는 정상적인 통증의 원리입니다.
2. 중추 감작 (Central Sensitization): 고장 나 버린 중앙 관제 시스템
문제는 통증 신호가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중추신경계(척수와 뇌)로 쏟아져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중추 감작은 이러한 지속적인 통증 폭격으로 인해, 척수와 뇌의 신경세포 자체가 과흥분 상태가 되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3 이는 현장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경보 신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중앙 관제 시스템 자체가 고장 나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통증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중추 감작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 이질통 (Allodynia): 원래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깃털로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자극조차 타는 듯한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 통각과민 (Hyperalgesia):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훨씬 더 심한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살짝 꼬집어도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통증은 더 이상 말초의 조직 손상을 반영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뇌와 척수 자체가 통증을 스스로 만들고 증폭시키는 ‘통증 발생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통증이 단순한 증상이 아닌, ‘신경계의 질병’으로 분류되는 이유이며, 가장 무서운 통증의 원리입니다.4
| 구분 | 말초 감작 (Peripheral Sensitization) | 중추 감작 (Central Sensitization) |
|---|---|---|
| 발생 장소 | 손상 부위 (말초신경) | 척수, 뇌 (중추신경) |
| 핵심 원인 | 염증 물질로 인한 유해수용기 과민 | 지속적 통증 신호로 인한 신경세포 과흥분 |
| 임상적 의미 | 급성 통증, 보호적 반응 | 만성 통증, 병리적 상태 |
| 주요 증상 | 손상 부위의 통각과민 | 광범위한 통각과민, 이질통 |
결론적으로,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작, 특히 중추 감작이라는 통증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초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고장 난 중추신경계의 통증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통증 치료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통증을 발생 원리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유해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등) 알아보며, 통증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 Latremoliere, A., & Woolf, C. J. (2009). “Central sensitization: a generator of pain hypersensitivity by central neural plasticity”. The journal of pain, 10(9), 895–926.
- Ji, R. R., Nackley, A., Huh, Y., et al. (2018). “Neuroinflammation and Central Sensitization in Chronic and Widespread Pain”. Anesthesiology, 129(2), 343–366.
- Woolf, C. J. (2011). “Central sensitization: implication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in”. Pain, 152(3 Suppl), S2–S15.
- Nijs, J., Van Houdenhove, B., & Oostendorp, R. A. (2010). “Recognition of central sensitization in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pain: Application of pain neurophysiology in manual therapy practice”. Manual therapy, 15(2), 13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