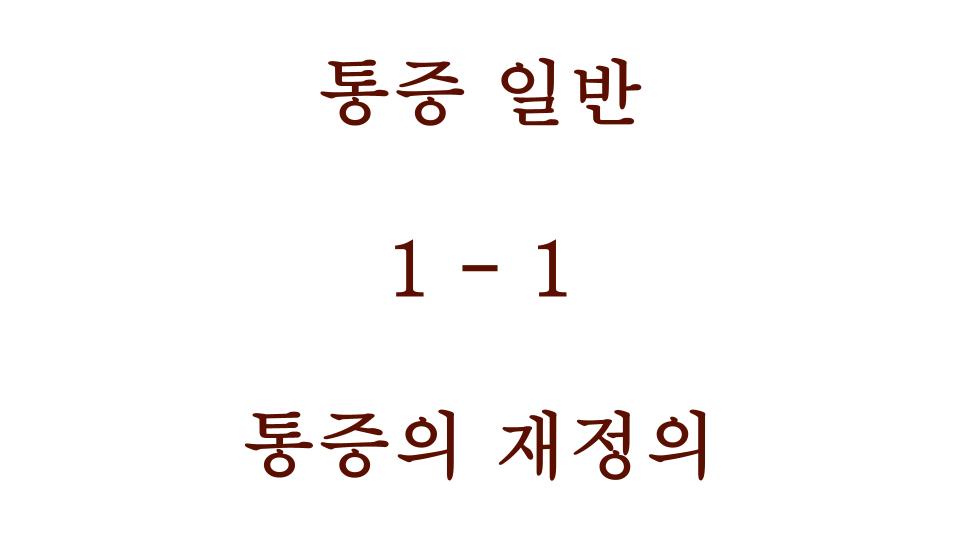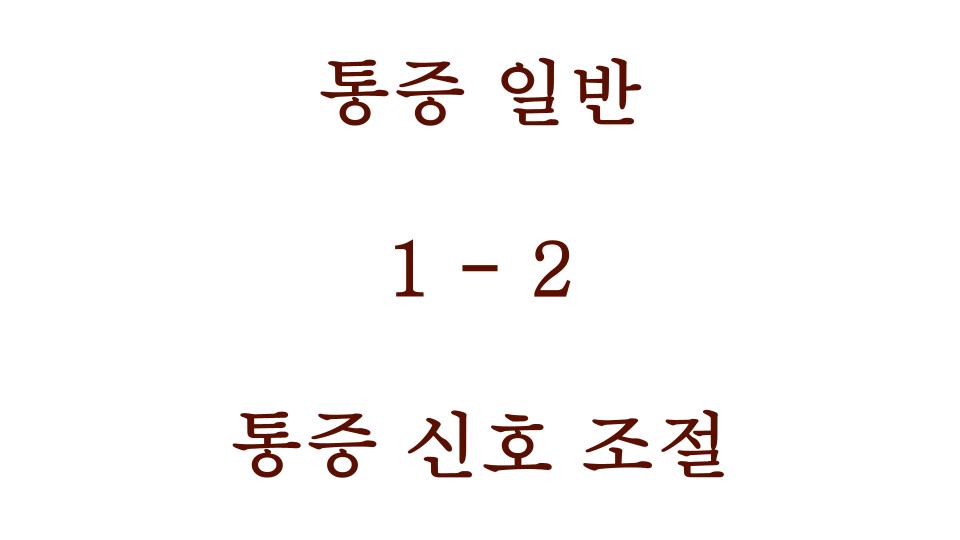3단계: 통증의 관문, 척수에서의 조절 (Modulation)
우리 몸의 말초신경에서 발생한 통증 신호는 고속도로를 타고 중추신경계의 첫 관문인 ‘척수’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는 그대로 뇌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통증 신호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척수 단계에서부터 그 신호를 걸러내고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1 통증의 여정 세 번째 단계인 ‘조절(Modulation)’은 바로 이 척수, 특히 척수의 ‘후각(Dorsal Horn)’이라는 부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통증 조절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증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1965년 멜작(Melzack)과 월(Wall)이 발표하여 통증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관문 조절설(Gate Control Theory)’입니다.2 이 이론은 우리가 아플 때 왜 무의식적으로 아픈 부위를 문지르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주는지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며, 통증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증의 문지기: 관문 조절설 (Gate Control Theory)
관문 조절설의 핵심은 척수의 후각에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것을 조절하는 ‘관문(Gate)’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문은 통증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혹은 문을 닫아 통증 신호를 약화시키거나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3 이 관문의 개폐 여부가 바로 통증의 원리를 좌우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 관문을 여닫는 열쇠는 바로 지난 글에서 배운 두 종류의 신경 섬유, 즉 통증을 전달하는 가는 신경(A-델타, C 섬유)과 통증이 아닌 다른 감각(촉각, 압력)을 전달하는 굵은 신경(A-베타 섬유)의 활성도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 관문이 열릴 때 (통증을 느낄 때): 유해 자극으로 인해 통증을 전달하는 가는 신경(A-델타, C 섬유)이 활성화되면, 이 신호는 관문을 ‘열어’ 통증 정보가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통증의 원리입니다.
- 관문이 닫힐 때 (통증이 줄어들 때): 아픈 부위를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촉각과 압력을 전달하는 굵은 신경(A-베타 섬유)이 활성화됩니다. 이 굵은 신경의 신호는 가는 신경의 신호보다 먼저 척수에 도착하여 관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닫힌 관문 때문에 뒤따라오던 통증 신호는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4
이것이 바로 모서리에 정강이를 찧었을 때 즉시 아픈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문지르는 이유입니다. 문지르는 행위(촉각 자극)가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과학적인 통증의 원리에 기반한 본능적인 행동인 셈입니다.
| 상황 | 활성화되는 신경 섬유 | 척수에서의 관문 상태 | 결과 (통증 인지) |
|---|---|---|---|
| 다쳤을 때 (자극 직후) | 가는 신경 (A-델타, C) 우세 | 관문 열림 (Gate Open) |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됨 (아픔) |
| 아픈 부위를 문지를 때 | 굵은 신경 (A-베타) 우세 | 관문 닫힘 (Gate Closed) | 통증 신호가 차단됨 (덜 아픔) |
관문 조절설은 단순히 일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현대 통증 치료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피신경자극치료(TENS)와 같은 물리치료나, 척수자극술 등은 모두 이 통증의 원리를 응용한 치료법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통증이 없는 자극을 주어 통증의 관문을 닫는 것입니다. 복잡한 통증의 원리를 이해하면 치료법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척수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통증 신호가 마침내 뇌에 도달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프다’고 최종적으로 인지하게 되는지, 그 네 번째 단계인 ‘인지(Perception)’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Todd, A. J. (2010). “Neuronal circuitry for pain processing in the dorsal hor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12), 823–836.
- Melzack, R., & Wall, P. D. (1965). “Pain mechanisms: a new theory”. Science (New York, N.Y.), 150(3699), 971–979.
- Moayedi, M., & Davis, K. D. (2013). “Theories of pain: from specificity to gate control”. Journal of neurophysiology, 109(1), 5–12.
- Dick, I. E., & Paskins, T. (2018). “Gate control of sensory neurotransmission in peripheral ganglia by proprioceptive sensory neurons”. Brain : a journal of neurology, 141(7), 1966–1979.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이론 설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