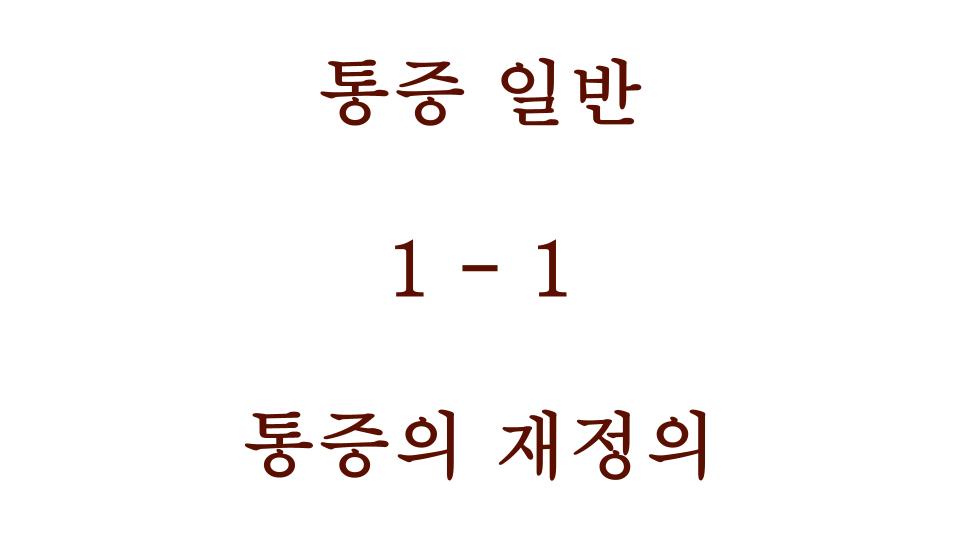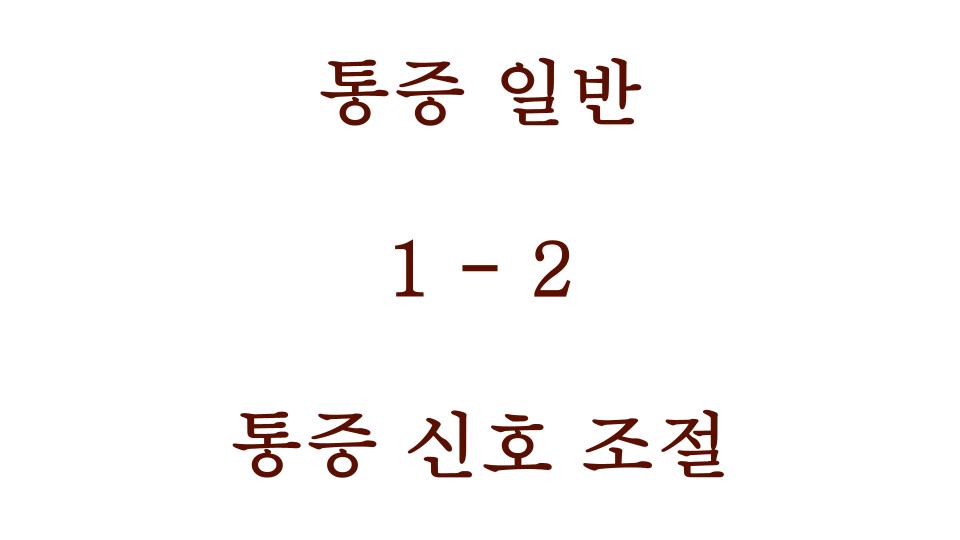2단계: 척수로 향하는 고속도로, 통증 전달 경로 (Transmission)
지난 글에서 우리는 우리 몸의 통증 감지 센서인 ‘유해수용기’가 유해한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전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통증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여정 두 번째 단계로, 말초에서 생성된 이 전기 신호가 중추신경계의 첫 관문인 ‘척수’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즉 ‘전달(Transmission)’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1 이 과정은 마치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서울의 중앙 지휘소로 보고되는 것과 같으며, 이때 이용하는 두 종류의 다른 ‘고속도로’가 존재합니다. 이 두 경로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다채로운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통증의 원리입니다.
팔을 꼬집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아야!’ 하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낀 뒤, 뒤이어 욱신거리고 기분 나쁜 통증이 서서히 밀려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통증 신호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속도와 성격을 가진 신경 섬유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2
KTX처럼 빠르고 날카로운 1차 통증: A-델타 섬유 (Aδ-fiber)
A-델타 섬유는 통증 정보를 전달하는 두 고속도로 중 ‘KTX’에 해당합니다. 이 신경 섬유는 비교적 굵고, ‘수초(Myelin Sheath)’라는 절연체로 덮여 있습니다. 수초는 전기 신호가 중간에 새지 않고 다음 정거장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도약 전도(Saltatory Conduction)’ 덕분에 A-델타 섬유는 통증 신호를 매우 빠른 속도(초속 5~30m)로 척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3
이 빠른 속도 덕분에 A-델타 섬유가 전달하는 통증은 순간적이고, 날카로우며, 통증의 위치가 명확한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통증(First Pain)’이라고 부르는 이 통증의 원리는, 위험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궁화호처럼 느리고 묵직한 2차 통증: C-섬유 (C-fiber)
C-섬유는 ‘무궁화호 완행열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 섬유는 A-델타 섬유보다 훨씬 가늘고, 수초가 없는 민달팽이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초가 없기 때문에 전기 신호는 도약하지 못하고 신경 섬유를 따라 느릿느릿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는 초속 2m 이하로 매우 느립니다.4
C-섬유가 전달하는 통증은 느리고, 둔하며, 욱신거리고, 타는 듯하며, 통증의 위치가 모호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통증(Second Pain)’이라고 부르는, 기분 나쁘게 오래 지속되는 통증의 정체입니다. 이 통증의 원리는 우리 몸이 손상되었으니 해당 부위를 계속 보호하고 쉬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A-델타 섬유 | C-섬유 |
|---|---|---|
| 비유 | 고속철도 (KTX) | 완행열차 (무궁화호) |
| 구조 | 굵고, 수초 있음 (유수신경) | 가늘고, 수초 없음 (무수신경) |
| 전달 속도 | 빠름 (5~30 m/s) | 느림 (< 2 m/s) |
| 통증의 성격 | 날카롭고, 찌르는 듯하며, 위치가 명확 (1차 통증) | 둔하고, 욱신거리며, 위치가 모호 (2차 통증) |
이처럼 통증의 전달 과정은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협주곡과 같습니다. A-델타 섬유가 “위험해, 피해야 해!”라는 긴급 경보를 울리면, 뒤이어 C-섬유가 “여기가 손상됐으니, 조심하고 잘 쉬어야 해!”라는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증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핵심적인 통증의 원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말초에서 출발한 두 종류의 통증 신호가 척수라는 첫 번째 관문에서 어떻게 걸러지고 조절되는지, 그 세 번째 단계인 ‘조절(Modulation)’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McLeod, G., & Taylor, A. (2019). “Basic pharmacology of local anaesthetics”. BJA Education, 20(2), 34–41.
- Ploner, M., Gross, J., & Schnitzler, A. (2002). “Cortical representation of first and second pain sensation in human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9(18), 12004–12008.
- 민족의학신문. (2015). “통증과 뇌”. Available from: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92
- OMRON Healthcare Korea. “통증의 매커니즘”. 생활 속 통증케어. Available from: https://m.omron-healthcare.co.kr/campaign/pain-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