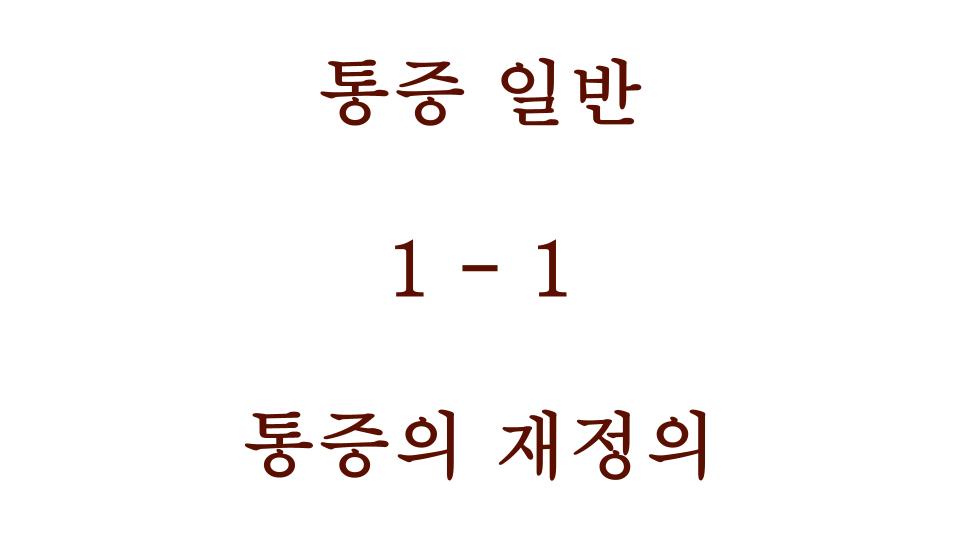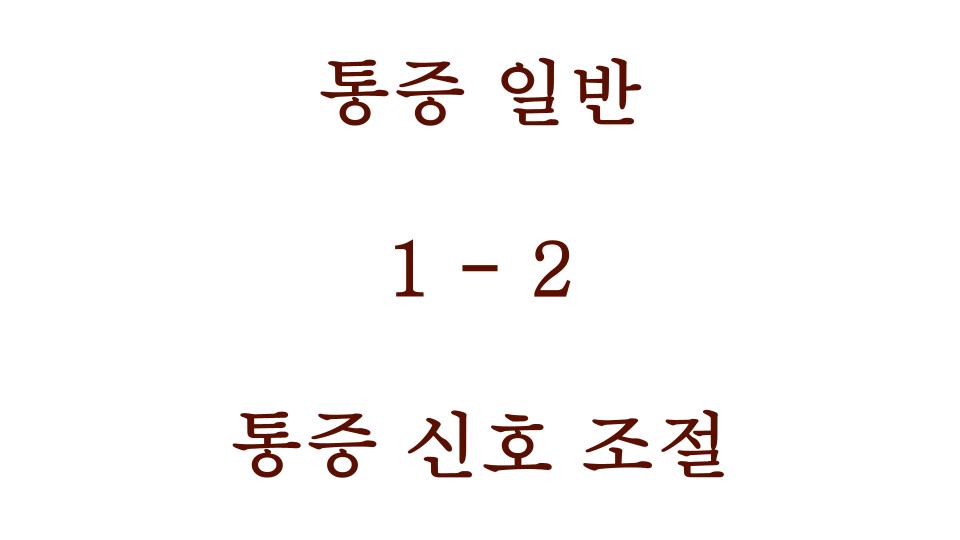1단계: 통증의 시작, 유해수용기 (Nociceptors)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기나긴 여정의 첫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몸 곳곳에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촘촘히 깔려 있는 특수한 감각 센서, ‘유해수용기(Nociceptor)’에서 비롯됩니다.1 피부, 근육, 관절, 심지어 내부 장기에까지 분포하는 이 예민한 센서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증 신호가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 즉 유해수용기가 어떻게 외부 자극을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꾸는지 그 놀라운 통증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수용기는 일반적인 감각 신경과는 다릅니다. 가벼운 만짐이나 부드러운 온도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조직 손상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하고 유해한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위험 전문 감지기’입니다.2
위험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Transduction)의 과정
망치에 손을 찧거나 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 유해수용기는 어떻게 이 물리적, 화학적 사건을 통증 신호로 바꾸는 걸까요? 이 과정을 ‘전환(Transduction)’이라고 부릅니다.3
유해수용기의 신경 말단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온 채널’이라는 단백질 문이 존재합니다. 유해한 자극이 가해지면, 이 특정 이온 채널들이 열리면서 세포 외부의 나트륨(Na⁺)이나 칼슘(Ca²⁺) 같은 양이온들이 신경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양이온의 유입으로 신경세포의 전기적 상태가 변하면서 활동 전위(Action Potential)라는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기 신호가 바로 통증 정보의 시작이며, 척수를 향해 전달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의 원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신호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유해수용기의 종류: 무엇을 감지하는가?
유해수용기는 감지하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 기계적 유해수용기 (Mechanical Nociceptors): 꼬집거나, 찌르거나, 강하게 누르는 등 과도한 기계적 압력을 감지합니다.
- 온도 유해수용기 (Thermal Nociceptors): 극심한 열(보통 45℃ 이상)이나 극심한 냉기(5℃ 이하)와 같은 위험한 온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 화학적 유해수용기 (Chemical Nociceptors): 조직이 손상될 때 방출되는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브라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등)이나 외부의 화학 물질에 반응합니다.
- 다양상 유해수용기 (Polymodal Nociceptors): 위의 여러 종류의 유해 자극에 모두 반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센서로, 우리 몸에 가장 흔하게 분포합니다.
| 유해수용기 종류 | 주요 감지 자극 | 자극의 예시 |
|---|---|---|
| 기계적 (Mechanical) | 과도한 압력, 찢어짐 | 망치로 맞음, 바늘에 찔림 |
| 온도 (Thermal) | 뜨겁거나 차가운 극단적 온도 | 뜨거운 난로에 닿음, 동상 |
| 화학적 (Chemical) | 염증 물질, 독성 물질 | 벌에 쏘임, 염증 부위의 통증 |
| 다양상 (Polymodal) | 기계적, 온도, 화학적 자극 모두 | 대부분의 조직 손상 상황 |
이처럼 통증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유해수용기라는 정교한 센서가 우리 몸의 이상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에서 시작됩니다.4 이 첫 번째 단계인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통증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해수용기에서 만들어진 이 전기 신호가 어떤 고속도로(신경 섬유)를 타고 척수까지 전달되는지, 그 두 번째 단계인 ‘전달(Transmission)’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Basbaum, A. I., Bautista, D. M., Scherrer, G., & Julius, D. (2009).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s of pain”. Cell, 139(2), 267–284.
- Gold, M. S. (2010). “Nociceptor sensitization in pain pathogenesis”. Nature medicine, 16(11), 1248–1257.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 신경생리”. 학술자료. Available from: http://bbs.neuro.or.kr/space/workshop/19/spring00edu02.pdf
- Julius, D., & Basbaum, A. I. (2001). “Molecular mechanisms of nociception”. Nature, 413(6852), 20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