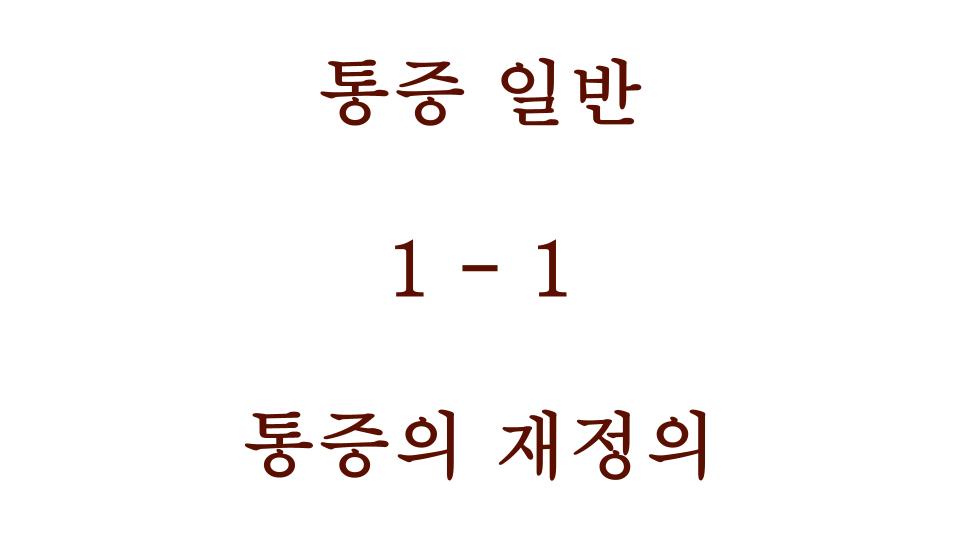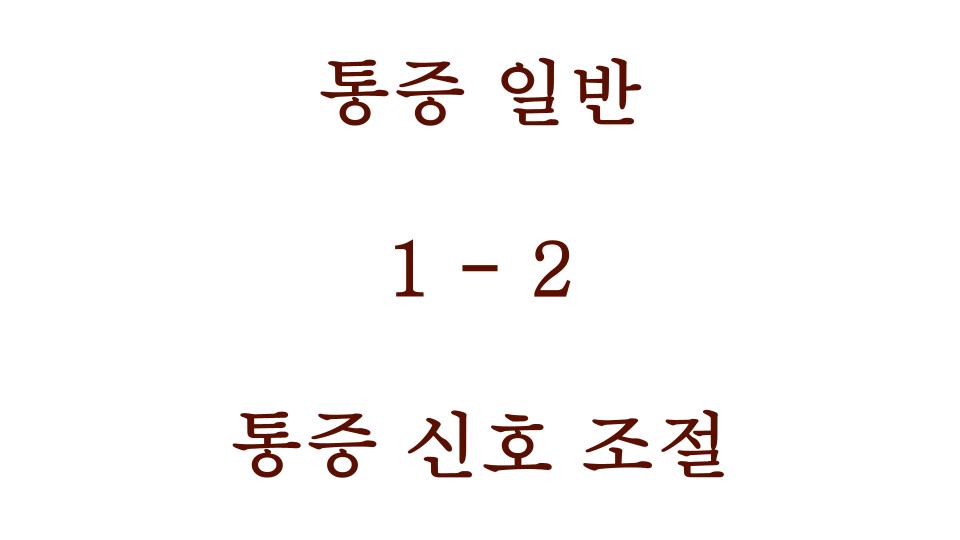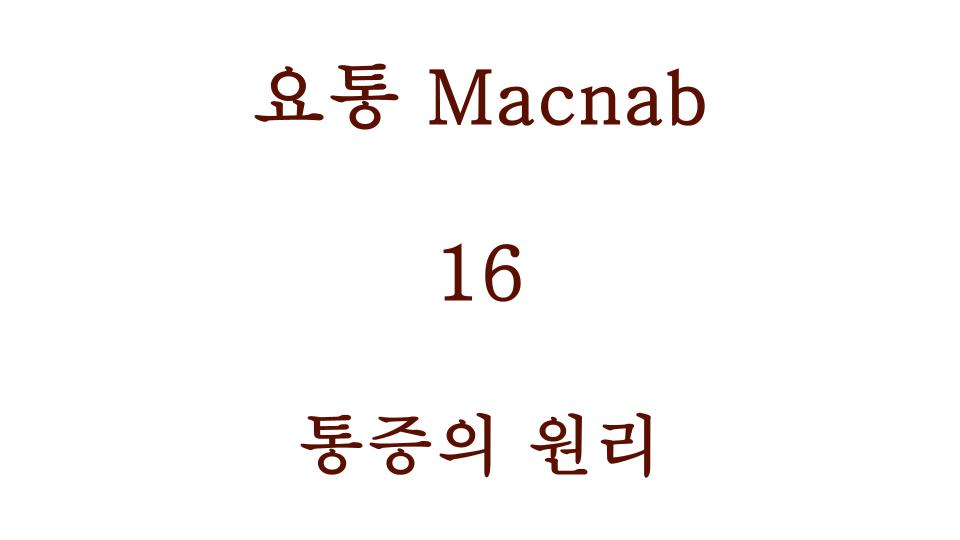
<요통 Macnab> 16. 통증의 원리, 뇌는 어떻게 통증을 느끼고 기억하는가? (급성통증부터 만성통증까지)
프롤로그: 통증, 불쾌한 감각인가 고마운 경고인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통증을 경험합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였을 때의 아픔, 운동 후의 뻐근함, 지긋지긋한 두통까지. 이처럼 통증은 피하고 싶은 불쾌한 감각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몸에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맹장이 터져도 신호를 알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인 ‘경고 시스템’이자,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감각’이기도 합니다.1
하지만 이 고마운 경고 시스템이 고장 나면, 통증은 그 자체로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질병’으로 변모합니다. 이번 『요통 Macnab』 16편에서는 이처럼 두 얼굴을 가진 감각, ‘통증(Pain)’의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통증 신호가 어떻게 발생하고 뇌까지 전달되며, 때로는 왜곡되고 증폭되는지 그 심오한 통증의 원리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통증의 두 얼굴: 급성 통증 vs 만성 통증
통증의 이중성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차이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단순히 지속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역할과 의미,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2
- 급성 통증 (Acute Pain): 조직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통증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같아서, 원인이 해결되고 조직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목적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 만성 통증 (Chronic Pain): 원래의 손상이 회복된 후에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통증입니다. 이는 화재가 다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울리는 고장 난 경보기와 같습니다. 더 이상 보호의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가 신경계의 질병이 되어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3
| 구분 | 급성 통증 (고마운 경고) | 만성 통증 (고장 난 경고) |
|---|---|---|
| 역할 및 의미 | 조직 손상을 알리는 보호적 신호 | 그 자체가 질병, 의미 없는 통증 |
| 지속 기간 | 손상 회복 시까지 (보통 3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지속 |
| 생물학적 원인 | 명확한 신체적 손상 |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 (중추 감작 등) |
| 치료 목표 | 원인 제거 및 손상 부위 치유 | 통증 관리 및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 |
이처럼 통증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험입니다. 급성통증이 만성통증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통증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달되며, 뇌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통증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4
다음 글에서는 통증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 우리 몸의 통증 감지 센서인 ‘유해수용기’의 역할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제통증학회(IASP). “Terminology”. IASP. Available from: https://www.iasp-pain.org/resources/terminology/
- Woolf, C. J. (2010). “What is this thing called pain?”.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120(11), 3742–3744.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 해부학 및 생리학”. Available from: https://www.e-hpr.org/upload/pdf/kjp_12_1_1.pdf
- Basbaum, A. I., Bautista, D. M., Scherrer, G., & Julius, D. (2009).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s of pain”. Cell, 139(2), 26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