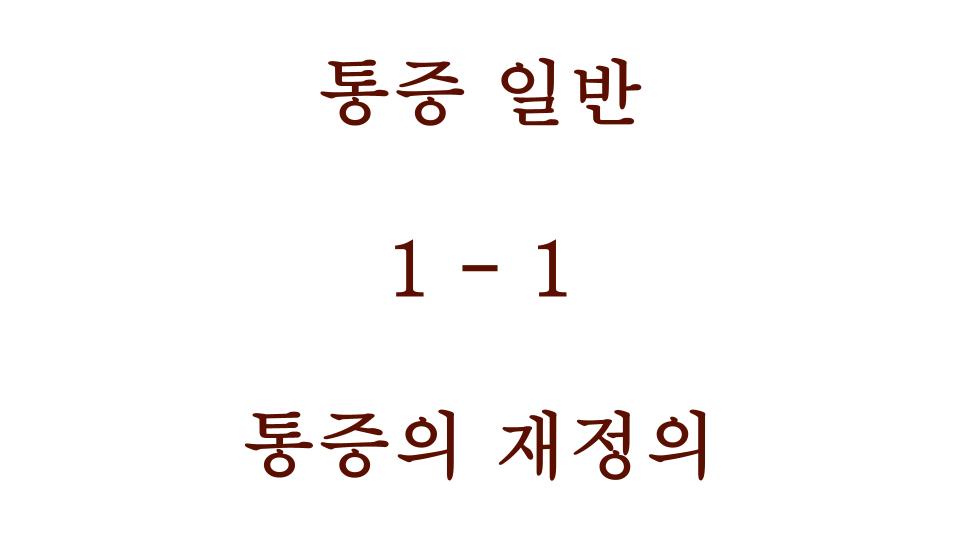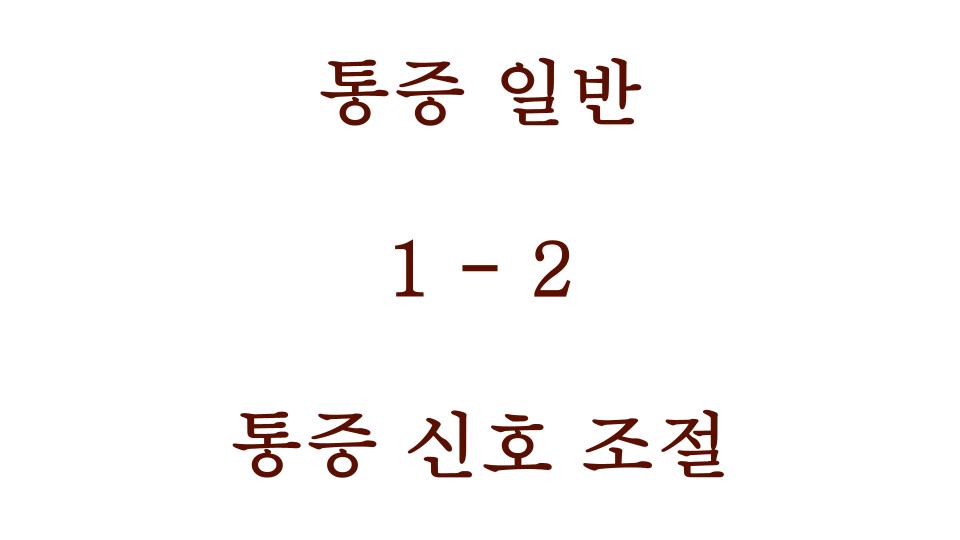끝나지 않는 통증: 만성 요통으로의 이행
대부분의 급성 요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급성 요통 환자 10명 중 1~2명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요통’으로 이행하게 됩니다.[1] 이 단계에 이르면 통증은 더 이상 단순한 조직 손상의 신호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 되어 환자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만성화의 늪’에 빠지기 쉬운 것일까요? 요통의 예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급성 통증이 만성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초기 통증의 양상과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만성화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요통의 예후는 단순히 얼마나 다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픈지’와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나쁜 예후의 예측 변수들
다음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만성 요통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예측 인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요통의 예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구분 | 위험 신호 (예측 인자) | 만성화에 미치는 영향 |
|---|---|---|
| 초기 증상의 특성 | 높은 강도의 초기 통증 | 통증이 심할수록 신경계가 더 강하게 자극받아 ‘통증 민감화’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
|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 동반 | 신경근이 직접적으로 압박받거나 염증이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 근육통보다 회복이 더딥니다. | |
| 심리사회적 요인 (Yellow Flags) | 통증에 대한 파국적 사고 | “이 통증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와 같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통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2] |
| 공포-회피 반응 | 움직이면 더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극도로 회피하여, 결국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 |
| 우울 및 불안 증상 | 우울감과 불안은 통증을 억제하는 뇌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
만성화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만성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성화는 급성기 이후 수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초기 손상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신경계가 점차 변하고(신경가소성), 결국 통증 조절 시스템이 고장 나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성 통증이 4주 이상 의미 있는 호전 없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 만성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특히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노란 깃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나쁜 요통의 예후를 바꾸는 핵심 전략입니다.[3]
다음 장에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각각 어떤 자연 경과와 요통의 예후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Chou, R., & Shekelle, P. (2010). Will this patient develop persistent disabling low back pain? JAMA, 303(13), 1295–130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185633
- Linton, S. J., & Shaw, W. S. (2011). Impact of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experience of pain. Physical Therapy, 91(5), 700-711. https://academic.oup.com/ptj/article/91/5/700/2735235
- Foster, N. E., et al. (2018). Prevention and treatment of low back pain: evidence, challenges, and promising directions. The Lancet, 391(10137), 2368-2383.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8)30489-6/full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