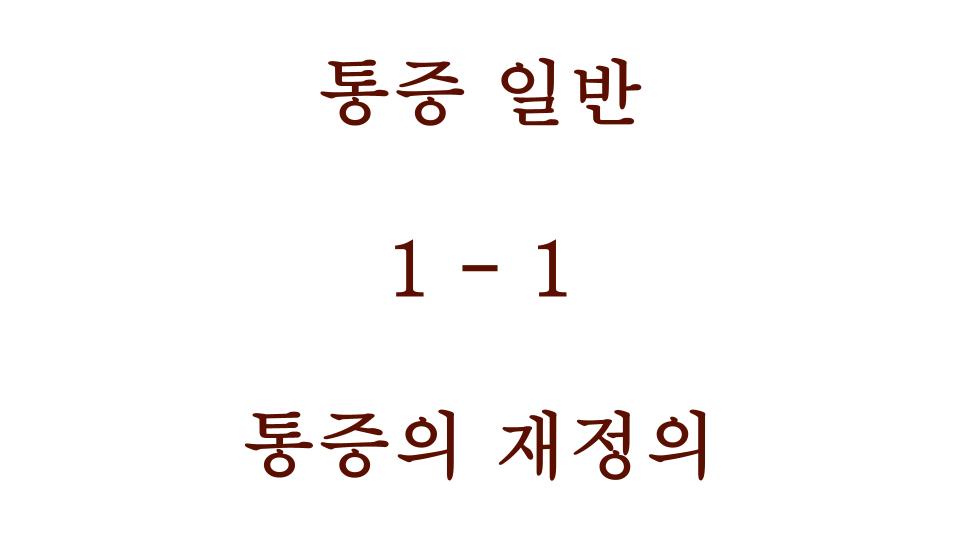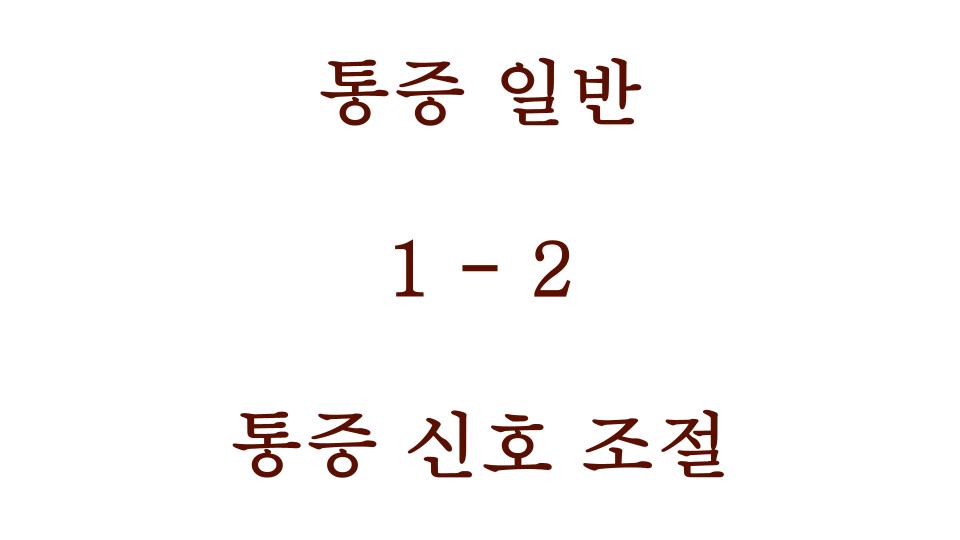중추 감작의 결과 ①: 통증의 확산과 이질통
중앙 통제실(척수와 뇌)의 신경계가 과흥분 상태로 변하는 중추 감작은 단순히 통증의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통증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으며, 급성 통증과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환자 본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들을 아는 것은, 만성 통증을 겪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살짝만 눌러도 너무 아파요”: 통각과민 (Hyperalgesia)
통각과민은 ‘과도한 통증’을 의미합니다. 아픈 부위를 살짝 누르거나 움직일 때,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통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중추 신경계의 ‘통증 볼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강도의 자극이 들어와도 뇌는 이를 몇 배 더 큰 통증으로 해석하고 증폭시키는 것입니다.[1] 이는 만성 요통 환자들이 마사지나 도수치료 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파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계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아파요”: 이질통 (Allodynia)
이질통은 중추 감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로, ‘다른 종류의 통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름 그대로, 원래는 절대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매우 가벼운 자극을 통증으로 인식하는 현상입니다.[2] 예를 들어, 허리에 옷이 스치는 느낌, 침대 시트의 감촉, 가벼운 손길, 심지어 시원한 바람이 닿는 것마저도 화끈거리거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척수에서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촉각’ 신호는 촉각 경로로, ‘통증’ 신호는 통증 경로로 각각 전달됩니다. 하지만 중추 감작 상태에서는 촉각 경로의 스위치가 잘못 켜지면서, 가벼운 접촉 신호가 통증 경로로 잘못 유입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이 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통증 현상 | 신경계의 오작동 방식 | 환자가 느끼는 실제 경험 |
|---|---|---|
| 통각과민 (Hyperalgesia) | 통증 신호의 ‘증폭’ (Volume Up) | “예전엔 뻐근하기만 했는데, 이젠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찢어질 듯 아파요.” |
| 이질통 (Allodynia) | 촉각 신호의 ‘회로 단선’ (Cross-Talk) | “샤워기 물줄기가 허리에 닿으면 따갑고 아파서 샤워하기가 두려워요.” |
| 통증의 확산 | 통증 신호의 ‘범람’ (Spreading) | “분명 허리가 아파서 시작했는데, 이젠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까지 쑤시고 아파요.” |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통증의 확산
만성 요통 환자들이 흔히 “MRI에서는 디스크 한 군데만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저는 허리 전체와 엉덩이까지 다 아프죠?”라고 묻습니다. 그 답 역시 통증 민감화와 중추 감작에 있습니다. 척수에서 과흥분된 신경세포들은 주변의 다른 신경세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통증 신호가 원래 손상 부위에 해당하는 신경 회로를 넘어, 인접한 다른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회로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은 최초의 시작점을 넘어 훨씬 더 넓은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MRI 소견과 환자가 느끼는 통증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이며, 만성 통증이 신체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닌 신경계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통증 민감화는 통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자료
- Meyer, R. A., et al. (1994). Peripheral neural mechanisms of nociception. In P. D. Wall & R. Melzack (Eds.), Textbook of pain (3rd ed.), pp. 13-44. Churchill Livingstone.
- Campbell, J. N., & Meyer, R. A. (2006). Mechanisms of neuropathic pain. Neuron, 52(1), 77-92. https://www.cell.com/neuron/fulltext/S0896-6273(06)0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