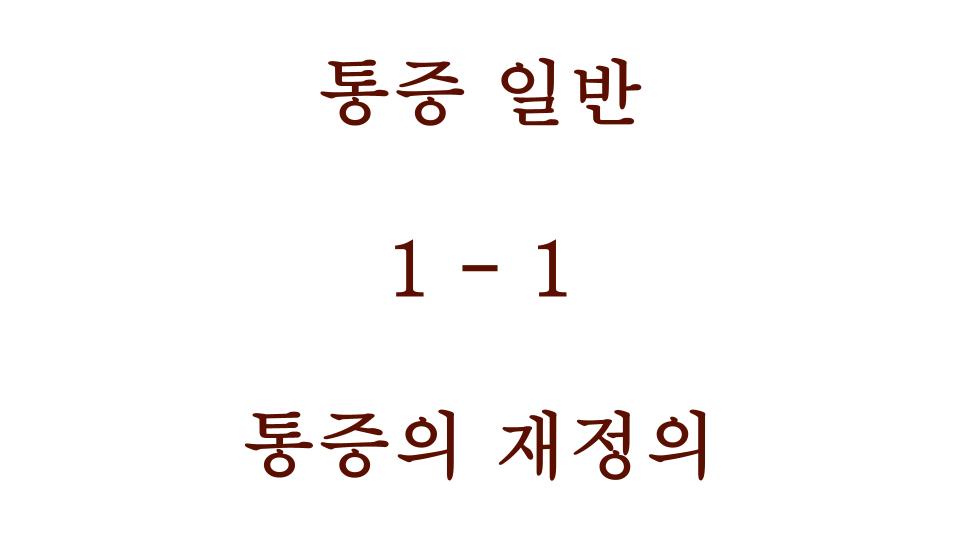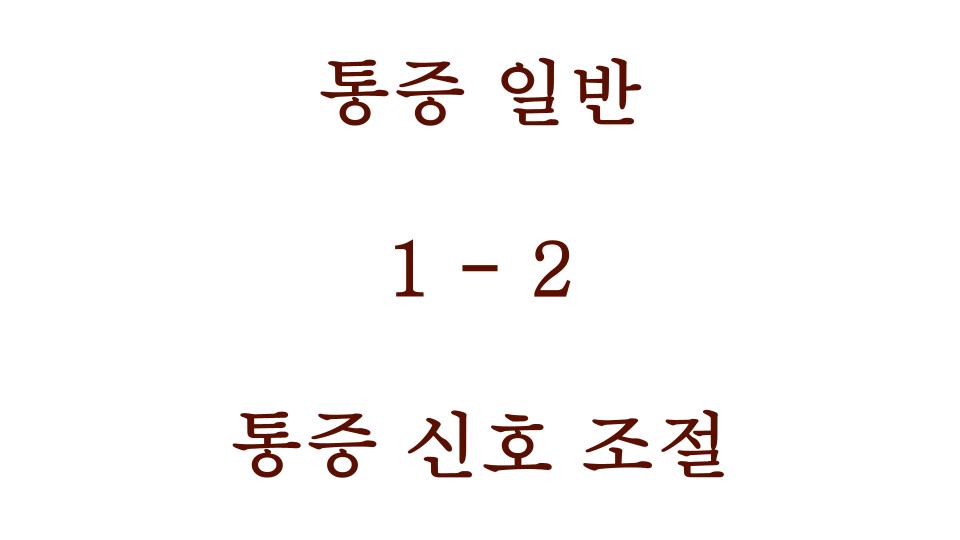1단계 민감화: 현장이 예민해지다 (말초 감작)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는 통증 신호가 어떻게 발생하고 척수로 전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경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만성 통증의 첫 번째 관문인 ‘말초 감작(Peripheral Sensitization)’이 시작됩니다. 이는 통증 민감화 과정의 첫 단계로, 통증이 시작된 ‘현장’, 즉 손상된 조직 주변의 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햇볕에 심하게 탄 피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옷깃이 스치는 가벼운 자극도, 햇볕에 탄 피부에 닿으면 화끈거리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는 피부의 통증 센서(통각수용기)가 자외선으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평소라면 무시했을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말초 감작은 바로 이 원리와 같습니다.[1]
화학적 폭풍 속의 통증 센서
허리 인대나 근육의 손상이 지속되면, 해당 부위에는 염증 매개물질들(프로스타글란딘, 브래디키닌 등)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이 ‘염증 칵테일’에 오랫동안 노출된 통각수용기는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통증 신호를 발생시키는 이온 채널의 수가 늘어나고, 더 쉽게 열리도록 변형됩니다.[2]
결과적으로 통각수용기의 ‘발화 문턱값(Firing Threshold)’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즉, 이전에는 ‘100’의 강도를 가진 자극에만 반응했다면, 이제는 ’10’ 정도의 약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여 통증 신호를 척수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 민감화의 시작이며,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욱신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 변화 | 상세 내용 | 결과 |
|---|---|---|
| 통증 문턱값 저하 | 통각수용기가 염증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통증을 느끼는 기준점이 낮아짐. | 이전에는 아프지 않았던 약한 기계적 자극(예: 가벼운 압력)에도 통증을 느낌. |
| 반응성 증가 | 같은 강도의 자극에도 통각수용기가 더 강하고 더 길게 전기 신호를 발생시킴. | 통증이 더 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짐. (통각과민) |
| 자발적 활성 |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통각수용기가 저절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기 시작함. |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욱신거리는 자발통이 발생함. |
이처럼 말초 감작은 손상 부위라는 ‘현장’에서부터 통증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중앙 통제실(척수와 뇌)로 끊임없이 보고되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만성 축성 통증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의 경보가 멈추지 않으면, 결국 중앙 통제실마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끊임없는 경보 신호가 어떻게 중앙 신경계까지 변화시키는지, 통증 민감화의 다음 단계인 ‘중추 감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Julius, D., & Basbaum, A. I. (2001). Molecular mechanisms of nociception. Nature, 413(6852), 203-210. https://www.nature.com/articles/35093019
- Ji, R. R., et al. (2014). Nociceptive sensitisation by inflammation: inflammatory mediators and their downstream signalling pathways. Pain, 155(10), 1975-1976.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163973/